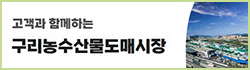고온기 포도나무 증발산량 1일 최대 5.4mm

물은 식물을 키우는데 기본 요소이지만, 관수량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다. 그동안 포도 재배의 골든 슬로건(Golden Slogan) 중 하나는 “포도는 생육 초기 물을 충분히 주고 성숙기에 반으로 줄인다”라는 것이다. 농가들은 이에 맞게 포도를 재배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농가는 사실 취지에 맞게 포도를 재배하지 않았다. 농가들은 성숙기 당도와 착색을 좋게 하려면 물량을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숙기에 강우량이 많아 물량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에는 비가림폭이 좁아 포도나무는 빗물을 쉽게 흡수해 생장했지만, 이제는 비가림폭이 확대되어 빗물을 원활히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했다.
그럼 성숙기 관수량을 반으로 줄이는 골든 슬로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는 포도 생육 시기별 관수량에서 유래된 것으로 증발산량과 밀접하다. 포도 생육 시기별 관수량을 보면 생육 초기(4∼5월)에 10a당 20∼25톤, 성숙기(7∼8월)에는 10a당 10∼15톤을 7일 간격으로 주게 됐다. 이처럼 포도 성숙기에 물량을 반으로 줄이라고 돼 있지만, 성숙기 증발산량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즉 포도 성숙기에 평균온도는 생육 초기보다 2배 정도 높고, 엽면적도 5배 이상 넓어 증발산량이 2배 이상 많다. 이처럼 성숙기에 증발산량이 많음에도 물량을 줄이는 것은 당도, 착색 등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기 강우량이 생육 초기보다 약 3.5배 많아서이다. 만약 포도 성숙기에 강우량이 월등히 많지 않았다면 물량을 반으로 줄이지 않았을 것이다.
농가들은 고품질 포도 생산하려면 성숙기에 관수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포도나무는 성숙기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포도나무 생육 단계별 관수량이 증발산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포도나무의 증발산량은 4∼10월까지 평균 1일 2.2∼3.3㎜, 7∼8월 고온기에는 1일 4.2∼5.4㎜이다.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관수량을 줄이는 7∼8월은 증발산량을 고려하면 물을 더 주어야 한다. 만약 농가 의도대로 성숙기에 포도나무에 공급되는 물량이 반으로 줄면 수분 부족에 의해 당도는 낮아지고, 착색도 불량하게 된다. 포도 성숙기에 물량이 줄어야 당도가 올라가고 착색이 좋아진다면 8월 강우량이 평년 대비 30% 수준으로 적었던 지난해에는 품질이 우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는 포도 뿐 아니라 다른 과일도 수확기 당도는 낮고, 착색은 불량했으며, 과일도 작았다.
우리나라 비가림시설은 1985년경 시작돼 1989년부터 빠르게 늘어났으며, 2000년 이후 광폭 비가림시설로 전환됐다. 2000년 이전에는 비가림폭이 80㎝ 정도로 좁아 빗물을 쉽게 흡수해 7∼8월에 물량을 반으로 줄여도 평년 월강우량만 내리면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가림시설의 비가림폭이 병해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넓어지면서 포도나무가 빗물을 온전히 흡수하기 어렵게 됐다. 농가들은 광폭 비가림시설에 내린 빗물이 포도나무에 원활히 흡수되리라 생각하는데, 흡수율은 매우 낮다. 전주지역에는 2024년 7월 강우량이 평년보다 100㎜ 이상 많은 398.3㎜가 내렸지만, 광폭 비가림시설(비가림폭 2.5m)에서 포도잎에 시듦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포도나무가 광폭 비가림시설에 있으면 강우에 관계 없이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한다.
포도 재배에 있어서 품질 향상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물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물에 대하여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관수량을 늘리면서 우수한 품질의 포도 생산에 힘쓰길 기대한다.
■박서준<농진청 원예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